
2016년 매체별 광고비를 살펴보면 1위 CATV/종편(1조 8천억), 2위 모바일(1조 7천억)에 이어 지상파TV가 3위(1조 6천억)가 되었다. 오랫동안 지상파TV는 빠르고 쉽게 광고의 유효도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채널이었다. 지상파TV의 약세는 결국 채널 춘추전국시대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모두 알고 있듯이 모바일 스마트폰이 있다. 모바일이 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생겨나고 있는데, 구글(Google)은 이를 ‘마이크로 모먼츠(Micro-Moments)’라고 명명했다.
구글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Consumer behavior and expectations have forever changed. With powerful phones in our pockets, we do more than just check the time, text a spouse, or catch up with friends. We turn to our phones with internet and expect brands to deliver immediate answers. It’s in these I-want-to-know, I-want-to-go, I-want-to-do, I-want-to-buy moments that decisions are made and preferences are shaped.” 즉, 소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바일을 사용하는 ‘그 순간(Moments)’ 브랜드가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크로 모먼츠(Micro-Moments)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구매행동모델에 관련된 마케팅 역사를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다 2004년 P&G에서 발표한 FMOT(First Moment of True) 모델과 2011년 구글에서 주장한 ZMOT(Zero Moment of Truth) 모델과 연결되는 것이 MMOT(Micro Moment of Truth) 모델이다.
FMOT(First Moment of True)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TVC 등 매스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포장, 디자인, 디스플레이, 점원의 설명 등 모든 접점이 소비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FMOT는 IMC(Inter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를 단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통합이 아닌 소비자 경험의 총체적 통합으로 봐야 하고, 이를 위해서 모든 소비자 접촉의 순간(Moment of Truth)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7년 후에 구글에서 주장한 ZMOT(Zero Moment of Truth)는 소비자 대부분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만나게 되기 전에 이미 검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검색을 통하여 본인과 비슷한 일반 소비자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실제 브랜드는 First Moment 이전에 Zero Moment에서 구매결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존 FMOT(First Moment of Truth)모델에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의 단계가 새롭게 추가되어 디지털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접촉의 순간(Moment of Truth)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소비자 접촉 경로를 디지털까지 확장하여 통합 디자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다시 6년이 지난 지금, 모바일로 인하여 사람들의 새로운 행동 패턴이 보인다. 구글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에 소비되는 시간은 주당 총 13.3시간으로 매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스마트폰에서 수행되는 개별 활동의 지속시간은 평균 약 1분 10초로 짧아지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디지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지만, 대신 더 자주, 더 짧게 인터넷을 사용한다. 사람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시간을 확인하는 등의 순간은 브랜드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이 뚜렷한 의도를 갖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순간에는 브랜드는 소비자와 연결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 브랜드는 즉각적인 응답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MMOT 모델의 핵심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FMOT, ZMOT, MMOT 모두 시대 상황에 최적화된 구매 행동 모델이며, 그 시대에 마케팅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광고 대비 MMOT(Micro Moment of Truth) 시대의 광고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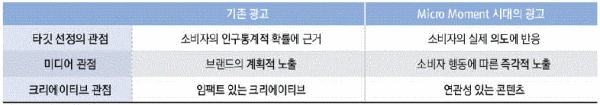
첫 번째는 타기팅의 관점 변화이다. 마케팅에서 핵심타깃을 선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하여, 혹은 마케터의 경험에 근거하여 인구 통계적 그룹 중 타깃층을 선정하고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우리 브랜드의 타깃이 누구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 타깃들이 ‘어떤 순간(Moment)’에 ‘무엇을 원하는가(의도)’ 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동안의 기술로는 그것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Needs)와 디지털 상에서의 CDJ(Customer Decision Journey)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는 미디어 관점에서 브랜드가 주도권을 가지고 미디어를 선정하는 ‘미디어 믹스’가 아닌 타깃들이 우리 브랜드를 필요로 하는 순간 즉각적인 노출을 할 수 있는 ‘실시간(Real-time) 오디언스 믹스’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관점에서 브랜드가 선정한 하나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관성(Relevant)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은 주관적인 광고보다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를 더 얻기 원한다. 또한, 그러한 정보를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들에게 있어서 내 삶과 연관성 없는 광고는 그냥 공해일 뿐이다. 소비자들이 하루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접하는 메시지의 수가 평균 1,600개가 된다고 한다. 그중 소비자가 기억하는 메시지는 과연 몇 개가 될까? 또 기억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을 것인가? 브랜드의 정보가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순간 사실 여부가 바로 가려지는 시대이다. 예를 들어 모든 무선 청소기 브랜드가 저마다 ‘강력한 흡입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비자는 몇 번만 검색해보면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흡입력을 가진 브랜드가 무엇인지, 흡입력 말고도 각 브랜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채널에서 +3, +5 같은 노출빈도(Frequency)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동영상 스킵 광고를 예로 들면 이용자의 76%는 동영상 앞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본적이 있는 광고가 강제로 노출될 때 스킵 가능시간이 줄어드는 것만 본다는 조사도 있다. ‘노출했다’와 ‘실제로 봤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즉,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가 칼자루를 쥔 세상에선 메시지를 push하기보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pull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MMOT(Micro Moment of Truth) 시대의 광고대행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먼저 분명히 말하고 싶은 점은 이 논의에 정답은 있을 수 없으며, Next Marketing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이야기는 상당히 개인적인 견해이자 회사의 고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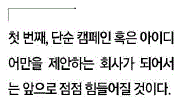
‘어마어마한 조회 수의 바이럴 영상 띄우기’ 혹은 ‘잘빠진 크리에이티브 뽑아내기’도 분명 대행사의 핵심 능력이겠지만, MMOT(Micro Moment of truth)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더 중요시 되는 대행사의 능력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철저하게 소비자의 니즈(혹은 의도)에 기반을 둔 기획 하에서 각각의 채널에 명확한 R&R(Role and Responsibilities) 부여하고, 최적화된 포맷으로, 각각의 콘텐츠를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다. 당연이 수많은 채널을 어떻게 정의하고, 예산을 분배하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콘텐츠의 세부적인 제작 가이드까지 만들어내는 일종의 진화된 ‘컨설팅 작업’이라 생각한다. 성공 캠페인 자체를 부정하자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영상 캠페인의 조회 수는 엄청나게 성공한 것 같은데 매출에 변동이 없어요”라는 광고주의 피드백이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성공한 캠페인은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하는 상황에 어떤 도움이 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획이 더 보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종 광고대행사와 컨설팅 회사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오히려 컨설팅 회사의 광고 매출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기존 컨설팅 회사들의 컨설팅 능력에 대행사 본연의 크리에이티브 능력, 세부적인 운영 능력을 모두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미래 광고대행사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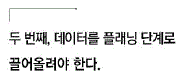
현재 대한민국의 데이터 마케팅은 곧 퍼포먼스 마케팅, 미디어가 중심이 되고 있다. DMP, DSP, RTB, Programatic AD 등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솔루션들의 대부분이 미디어 단계에서는 논의 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미디어 기반의 데이터 마케팅이 태동기라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현재 시점에서 너무나 명확한 한계가 보이는 것이 문제이다. 바로 ‘모수’의 한계성이다. 포털 사이트는 적용이 안 되고, 그렇게 데이터 분석했는데 결국 최종 크리에이티브가 배너광고이다 보니 클릭률이 너무 낮고, 몇 번의 타깃 세분화 작업을 하면 모수가 한없이 초라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MMOT(Micro Moment of Truth) 시대의 핵심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 파악과 그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길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을 파악하고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데이터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때문에 대행사는 미디어 단의 데이터 분석가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통하여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가장 최적의 채널과 메시지를 선별하는 플래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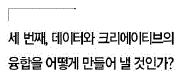
개인적으로는 향후 데이터 마케팅의 헤게모니는 점차 광고주에게로 옮겨갈 것이다. 그 이유는 데이터가 곧 개인정보라는 인식이 남아있고, 세일즈까지 매칭하여 데이터를 보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공유가 부담스러움을 알면서도 현재 조직상의 이슈로 대행사에 의뢰하는 것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광고주 측에서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 경우를 상상해보자. 수많은 데이터에 기반 된 매체 기여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있는 광고주 앞에서 데이터를 모르는 대행사가 제대로 된 미디어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대행사가 노력한다 해도 광고주보다 광고주 데이터를 잘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대행사 입장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대행사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 결국, 대행사의 능력은 크리에이티브이다. 힘들게 데이터를 통하여 소비자 니즈(Needs) 및 타깃 세분화를 했는데 크리에이티브가 세분화되지 않고 단일 크리에이티브로 노출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는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를 어떻게 크리에이티브에서 풀어줄 것인가? 가 대행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MMOT(Micro Moment of Truth) 시대에 적합한 광고 대행사의 역량을 이야기했다. 이 글을 쓰면서 계속 본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현재 광고대행사 조직구조로는 위에서 언급한 역량이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캠페인 디렉터가 오프라인은 물론 검색, 소셜, 동영상, 퍼포먼스를 전부 이해해야 하고, AP들은 디지털 데이터를 통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정립해야 한다. 또 크리에이터도 데이터를 볼 줄 알고 그것을 크리에이티브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제작물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 현재 대행사의 분업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 모든 것이 기존 조직구조의 본원적인 융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디지털 마케팅 시장은 또다시 변화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것이고,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많은 대행사가 시대에 맞는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경쟁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광고주보다 먼저 트렌드에 맞는 조직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 그것이 결국 대행사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광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무리 조직이 융합되더라도 개인의 내적 능력이 융합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생각된다. “난 (기존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략을 고민할 테니 디지털은 알아서 뒤에 붙여줘”라고 생각하시는 전략기획, “숫자는 눈에 안 들어오니 기획에서 알아보기 편하게 설명해줘”라고 하시는 크리에이터, “오프라인 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는 문법 자체가 달라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해보자”는 미디어 플래너 등 이런 생각이 조직 안에 있다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조직을 융합한다고 해도 그 조직은 성공하기는 힘들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했다. 새로움을 익히는 것은 어렵지만 융합인재 만이 새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새 시대의 광고영웅들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