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저게 뭐야?”
TV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괴상한 녀석이 마구 뛰어온다. 뒤뚱뒤뚱, 마치 목도리를 두른 듯 목이 불룩하게 생긴 도마뱀이다. 뒤뚱뒤뚱… 이윽고 날렵하게 생긴 자동차 한 대가 신나게 달리면서 고속도로 끝으로 사라져 간다.
 “길은 별처럼 많다. 유유히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자! 미라주와 함께” 광고가 나가자마자 이 호주산 도마뱀은 일약 스타가 되었다. 이 광고는 인구에 회자하였다.
“길은 별처럼 많다. 유유히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자! 미라주와 함께” 광고가 나가자마자 이 호주산 도마뱀은 일약 스타가 되었다. 이 광고는 인구에 회자하였다. 온 일본 열도가 떠들썩했다. 이 도마뱀을 마스코트로 만들어 가슴에 달고 다니는 아이들마저 생겨났다. 예정된 시나리오처럼 ACC(전 일본CM협의회) 대상을 받았다. 그러나 도마뱀 소동만 일으켰을 뿐 자동차는 팔리지 않았다.
역시 ACC대상을 받았던 테크닉스의‘ 원음의 마음’ 시리즈는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에디트 피아프·마할리아 잭슨·파블로 카살스 등 음악의 거장들이 빛바랜 흑백 화면 속에 등장했다. 파블로 카살스. 그의 앙코르 연주는 언제나‘ 새의 노래’였다. 최후의 연주가 된 1971년 유엔총회장에서의 자선 콘서트. 아흔다섯 살의 노 연주가는 다시 첼로를 잡았다.
사랑과 평화의 기원을담고.“ 카탈루냐의 작은 새들은 푸른 창공을 날면서 항상 이렇게 노래합니다. 피스(평화), 피스(평화), 피스(평화)…” 그 불끈 움켜쥔 주먹이 지금도 진한 아픔으로 가슴에 남아있다. 길이가 90초나 되는 이 장편(?) 또한 그 큰 감동에도 불구하고 판매에는 그리 감동적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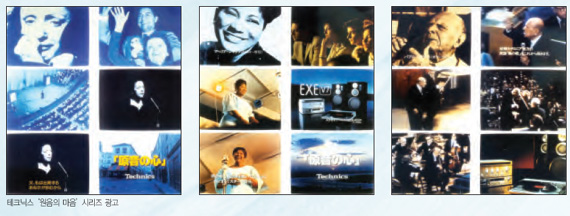
우리나라도 보드카가 한창이던 시절 하야비치·알렉산더·로진스키 등 보드카 광고가 잘 만든 것이라 해서 상을 휩쓸었지만 지금 그 제품들은 어느 것 하나 시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놀라움이며 무엇을 위한 감동인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광고의 모든 것은 '파는 것'으로 통해야 한다
벤튼 앤 보울 사의 유명한 슬로건 그대로,‘ 팔지 못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It’s not creative unless it sells).’ 적어도 광고에서는 그렇다. 광고회사 면접 시험장에서 흔히 카피라이터 남자 지원자들이 시장에 자주 가는 편이냐는 엉뚱해 보이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되는 것도 세일즈맨십이 광고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초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그림이 그럴 듯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 말이 그럴 듯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 심사위원들은 광고가 판매수단이라는 사실을 자주 깜빡해 버린다. 광고를 사회윤리 교과서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정도로 착각하지 않나 싶을 만큼 폼 나는 말과 폼 나는 그림에 집착한다. 얼마나 판매에 이바지했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광고를 좋아했는가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심사위원들만 그랬을까? 거기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쏙 빠져도 괜찮을까? 광고주의 제품보다 내 얄팍한 재능을 팔기에 더욱 열심이지는 않았는가?“ 그 물건 사고싶던데” 보다“ 그 헤드라인 죽이던데” 그 한 마디에 더 우쭐하지는 않았는가? 폼나는 것도 좋고 때깔 나는 것도 좋지만, 그 폼도 때깔도 모두 더 잘 팔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아트 디렉터는 그 레이아웃이 더 잘 파는 데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해명해 낼 수 있어야 하며, 카피라이터는 그 헤드라인이 더 잘 파는 데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는 멀고 광고주는 가깝다?
덩샤오핑이 말했다던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이라고.‘ 꿩 잡는 게 매’라고, 광고는 파는 놈이 장땡이다. 과학이든 예술이든 광고는 우선은 잘 파는 것이어야 한다. 날지 못하는 것은 비행기가 아니다. 날 수 있고, 난 다음에 디자인도 찾고 폼도 찾는 것이다. 날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비행기가 아니다.
대단한 조형작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이 안 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럴 듯한 그림을 위해 광고를 만들고 있지 않는 한. ‘말 감(感)’이 좋아서? 세일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말 감이 문제가 아니다. 배경음악도 모델도, 시작은 더 잘 팔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 목적은 어디로 가고 수단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다. 배경음악을 위한 배경음악, 모델을 위한 모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팔려야 할 제품은 안 팔리고 모델만 잘 팔린다. 그래서 모델료만 잘도 올라간다.
포드자동차 회사를 다시 일으킨‘ 헨리포드의 특별 발표’, 셔위코디영어학원의‘ 당신은 영어에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데일 카네기의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 왓킨스의 <세계걸작광고 100선>을 처음 봤을 때 그 촌스러움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조잡한 일러스트, 맹물 같은 헤드라인. 그러나 그 광고들은 시장을 움직였던, 움직인 정도가 아니라 흔들었던 광고들의 전당인 것이다.
흔히 보는 사용 전 사용 후 두 장의 사진을 제시하는 머리염색약이나 살 빼는 약, 3달이면 일어가 술술 나온다는 학원광고. 광고의 아트워크는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고전적 수법 앞에서 마음이 흔들린다. 속는 줄 알면서도 속아준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하면서도 그 마지막은 오늘도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사무실 높이는 하늘과 가까워도 눈높이는 땅과 가까워져라
이낙운 선생의 <광고제작의 실제>에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나온다. 어느 해, 미국 광고 Worst 100을 뽑았는데 모 광고회사가 만든 광고가 3개나 들어있었다. <Ad Age> 기자가 비꼬듯이 물었다. ”하나도 끼기 어려운데 어떻게 3개나 낄 수 있었죠?” 그 광고회사 사장이 대답하기를“ 물론 저희도 소비자에게 기쁨도 주고 장사도 잘 하는 광고를 만드는 것을 이상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욕을 좀 먹더라도 장사를 하는 광고를 만듭니다. 우리에게 욕도 얻어먹지 않고, 남의 눈에 띄지도 않는 광고란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은 광고주의 돈을 그냥 갖다 버리는 일이니까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작년에 실력이 모자라서 봐서 즐겁고 장사도 잘하는 광고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욕은 좀 먹었더라도 장사는 꽤나 잘 하는 광고는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욕먹는 것을 피해서 욕도 먹지 않고 주의를 끌지도 못하는 광고를 만들었다면 아마 당신은 지금 나를 만나지 못했을 거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문을 닫고 나는 집에서 애나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고층빌딩 꼭대기에 있는 광고회사 사무실들. 사무실은 공중에 떠있어도 광고 크리에이터들의 생각은 땅으로 내려와야 한다.
‘소비자는 멀고 광고주는 가깝다. 광고회사의 고객은 소비자가 아니다. 바로 광고주다. 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선 광고주의 결재다. 소비자의 결재가 아니다. 물론 그 광고주의 결재가 소비자의 결재와 결코 무관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언제나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게 마련이다.‘ 소비자는 멀고 광고주는 가까우니 광고회사는 자꾸 광고주의 눈치나 보게 마련이다.’
우리나라 광고주들 중에는 광고회사나 광고회사 직원을 하청업체나 하수인쯤으로 대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라고 외쳐보지만 메아리 없는 발악이기 일쑤다. 광고주가 그림 그리고 광고주가 헤드라인 쓰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광고 중의 상당수가 광고주 회사 사장님이나 회장님을 목표집단(target person)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